|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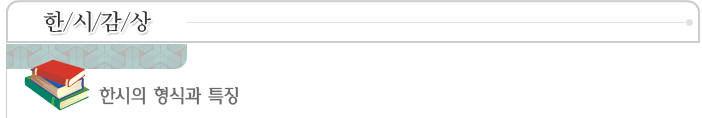
| |
| |
고체시(또는 ‘고시’라고도 한다)는 당나라 초기에 근체시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지어진 시체를 말한다. 고체시는 평측과 압운에 구애받지 않고, 시구(詩句)에 별 제한이 없으며(4구에서부터 그 이상인 것), 한 구의 자수도 4자, 5자, 7자로 된 것과 자수에 제한이 없어서 일정하지 않은 장단구(長短句) 등 다양하다. |
|
| |
4언시(四言詩) : 1구가 4자로 된 것
5언시(五言詩) : 1구가 5자로 된 것
7언시(七言詩) : 1구가 7자로 된 것
잡언시(雜言詩) : 각 구의 자수가 일정하지 않은 것 |
| |
근체시(또는 ‘율시’라고도 한다.)는 고체시에 이어 당나라 때 발생한 시형으로 고체시보다 작품상의 규칙이 엄격한 시로 구수의 제약은 물론, 음수율과 글자 수의 제한, 음위율(音位律)인 압운법(押韻法), 음성율(音聲律)인 평측법(平仄法) 등이 일정하고, 또 대우의 구성 방식도 규칙성을 띤다.
⑴ 절구(絶句)
절구는 기구(起句), 승구(承句), 전구(轉句), 결구(結句)의 4구로 이루어지고, 한 구의 자수가 5자인 것을 5언 절구(五言絶句), 7자인 것을 7언 절구(七言絶句)라 한다.
⑵ 율시(律詩)
율시는 1·2구인 수련(首聯), 3·4구인 함련(頷聯), 5·6구인 경련(頸聯), 7·8구인 미련(尾聯)으로 구성되며, 1구의 자수가 5자인 것을 5언 율시(五言律詩), 7자인 것을 7언 율시(七言律詩)라 한다.
⑶ 배율(排律)
시구에 제한이 없는 10구 이상의 짝수 구로 된 긴 시를 배율(排律)이라 하는데, 1구가 5자인 것을 5언 배율(五言排律), 1구가 7자인 것을 7언 배율(七言排律)이라 한다. |
|
| |
한자는 초·중·종성의 세 가지 소리로 나뉘는데, 초성을 자모(字母)라 하고, 중성과 종성을 합해서 운모(韻母)라 한다. 이 운모가 같고 성조도 같은 계열의 글자로 맞추는 것을 ‘압운(押韻)’이라고 한다. 이 운자는 옛 운서에 따라 고음(古音)대로 쓰므로 현대음과 다른 것도 있다. 종성이 없는 것은 중성만 같으면 같은 운이 되며, 짝수 구 끝에 압운하고, 첫째 구 끝에는 압운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
|
| |
중국어 음운 체계는 ‘사성(四聲)’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조를 가지고 있다. 사성은 평성(平聲), 상성(上聲), 거성(去聲), 입성(入聲)의 네 가지 성조를 말하며, 상·거·입성을 측성(仄聲)이라고 한다. 한시에서는 낮고 평평한 소리인 평성에 해당하는 글자와, 올라가거나 낮아지거나 하는 소리인 측성에 해당하는 글자를 일정하게 배치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를 ‘평측법’이라 한다.
평측법 중 첫째 구 둘째 자가 평성으로 시작하는 것을 ‘평기식(平起式)’이라 하고, 측성으로 시작하는 것을 ‘측기식(仄起式)’이라 한다. 오언 근체시는 측기식이 정격(正格)이고, 칠언 근체시는 평기식이 정격이다. 절구에서의 평측법을 참고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
| |
대우(對偶)란, 율시에서 한 연의 상하구(上下句)가 서로 짝이 되게 하는 수사법(修辭法)을 말하는 것으로 대장법(對仗法)이라고도 한다. 절구(絶句)에서는 대우법을 쓰기도 하고 쓰지 않기도 하지만, 율시(律詩)에서는 함련(頷聯)과 경련(頸聯)은 반드시 대우로 구성해야 한다. |
|
| |
┌─林亭秋已晩(숲 속 정자에 가을이 이미 늦어)
└─騷客意無窮(시인의 생각 끝없이 일어나네.)
┌─遠水 連 天碧(먼 물은 하늘에 닿을 듯 푸르고)
 ↑ ↑  ↑ ↑  ↑ ↑
└─霜楓 向 日紅(서리맞은 단풍은 해를 향해 붉네.)
┌─山 吐 孤輪月(산은 외로운 둥근 달을 토하고)
 ↑ ↑ ↑ ↑  ↑ ↑
└─江 含 萬里風(강은 만리의 바람을 머금네.)
┌─塞鴻何處去(변방의 기러기는 어디로 가나?)
└─聲斷暮雲中(울음소리 저녁 구름 속으로 끊어지네.) |
| |
①기승전결(起承轉結)
한 수의 시상을 4단계로 구성하는 방법으로, ‘기(起)’에서 시상을 일으키고, ‘승(承)’에서 시상을 이어 받아 확대·발전시키며, ‘전(轉)’에서 시상에 변화를 주어 비약 또는 전환시켰다가, ‘결(結)’에서는 전체의 시상을 마무리하는 방법이다. 절구는 한 구씩, 율시는 두 구씩 구성한다. |
|
| |
雨歇長堤草色多(비 개인 긴 둑에 풀빛 짙은데)
送君南浦動悲歌(임 보내는 남포에는 슬픈 노래 울리네.)
大同江水何時盡(대동강 물은 언제 다하랴?)
別淚年年添綠波(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보태어 지는데.)
(정지상 <送人>) |
| |
② 서경(敍景)과 서정(抒情)
한 편의 시의 시상을 전개할 때 주로 앞에서는 객관적인 사상(事象)이나 정경으로 도입·전개하고, 뒤에서는 주관적인 감상이나 정서를 표현하여 전환·총괄한다. 곧, 주로 앞에서는 서경(敍景)을, 뒤에서는 서정(抒情)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는 선경(先景)과 후정(後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차경기의(借景寄意)라고 한다. |
|
| |
擊鼓催人命(북을 쳐서 사람의 목숨을 재촉하는데)
西風日欲斜(서쪽 바람에 해는 기울려고 하네.)
黃泉無一店(황천 가는 길엔 주막 하나 없으리니)
今夜宿誰家(오늘밤엔 누구의 집에서 잘꼬?)
(성삼문 <臨死賦絶命詩>) |
| |
한시의 수사는 매우 다양하며 여기서 모두 다룰 수 없고, 위에서 다룬 대우법 외에 비유, 상징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비유(比喩)
비유란 어떤 사물이나 관념을 그것과 유사한 다른 사물이나 관념과 연결시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생동감 있고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다. 비유는 두 사물의 유사점에 근거하여[유추(類推) 관계],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비유에는 직유, 은유, 풍유 등이 있다.
㉮ 직유(直喩)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사물을 직접 드러내어 비유함으로써 두 사물의 유사성을 부각시켜 원관념의 뜻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내는 수사법으로, ‘如, 若, 猶, 似‘ 등이 쓰이는데, 음수율(音數律 : 자수 제한)로 인하여 생략되기도 한다. |
|
| |
時春山氣佳(봄 되니 산 기운 아름답기도 한데)
谷鳥如喚客(골짜기의 새는 길손을 부르는 듯.)
(이제현 <朴淵>) |
| |
㉯ 은유(隱喩)
본뜻은 숨기고 비유하는 형상만 드러내어, 표현하는 대상을 설명하거나 그 특질을 묘사하는 표현 방법이다. 은유 역시 직유와 마찬가지로 동일성, 유사성의 원리에 의한 비유라는 점은 같으나 형식이 다르다. 직유가 ‘A like B'의 형식인데 비해서 은유는 ’A is B' 또는 ‘A = B'의 형식을 취하여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한시에서는 영어의 ’is'에 해당하는 계사(繫辭)인 ‘是, 爲’ 등이 대체로 잘 쓰이지 않으므로 ‘A = B'의 형식이 대부분이고 ’A'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
|
| |
萬尋澄澈靑銅鏡(만 길의 맑은 물은 청동 거울이요)
千尺逶池百玉虹(천 척의 구불구불한 물줄기는 백옥 무지개라.)
怪底古今流不盡(괴이하도다!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흐르니)
層岩直上是龍宮(층암을 바로 오르면 용궁이라오.)
(이제현의 <朴淵>)) |
| |
㉰ 풍유(諷諭)
원관념[본의(本意)]을 숨기고 보조 관념(비유하는 말)만 드러내어 그 숨은 뜻을 넌지시 나타내는 수사법으로, 교화적이고 풍자적인 경우에 많이 쓰인다. |
|
| |
當年叩馬敢言非(당년에 말고삐 잡고 감히 그른 것을 말하니)
大義堂堂日月輝(대의는 당당하게 일월처럼 빛나네.)
草木亦霑周雨露(초목도 역시 주나라의 우로에 젖었으니)
愧君猶食首陽薇(그대가 수양산의 고사리를 먹은 것조차 부끄러워하노라.)
(성삼문) |
| |
② 상징(象徵)
상징(symbol)이란, 추상적인 사물이나 개념에 대하여 그것을 상기시키거나 연상시키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감각적인 말로 바꾸어 표현하는 수사법이다. 은유가 상사성(相似性) 혹은 유사성(類似性)을 통한 결합이라고 한다면, 상징은 전혀 이질적인 두 사물, 곧 심상과 관념이 내면적인 유사성을 암시하거나 진술하는 표현 양식이다.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관계에서 보면, 원관념이 배제되고 보조 관념이 독립되어 함축적인 의미와 암시적 기능을 갖는다. |
|
| |
群邪黜兮賢彙征(간사한 무리 축출하자 어진이 등용되고)
衆陰消兮世文明(뭇 음기 사라지니 세상이 문명하네.)
早晩春風遍四瀛(조만간 봄바람이 천하에 고루 퍼지면)
坐看萬物自生成(앉아서 만물이 절로 생성함을 보게 되리라.)
(이제현의 <冬至>) |
| |
<자료출처 : 제7차 고등학교 한문 교육과정해설서>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