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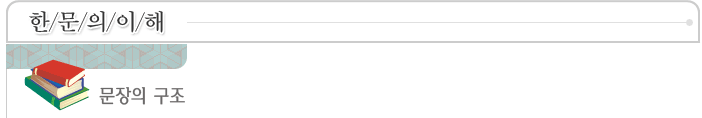
| |
| |
‘문장’이란, 하나의 완결된 생각을 나타낸 언어 단위로, 일반적으로 주부(主部)와 술부(述部)로 이루어진다. 주부를 이루는 성분이 주어이고, 술부를 이루는 성분에는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이들 성분을 주성분(主成分)이라 한다. 주성분은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성분으로서 문장을 이루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성분이다. 그리고 주요 성분에 덧붙어 이를 수식하거나 한정하는 관형어, 부사어 등을 부속 성분(附屬成分)이라 한다. |
|
| |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주어는 행동 주체를, 서술어는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이(가) ~하다’, ‘~이(가) ~이다’로 풀이한다. 어순은 우리말 어순과 동일하다. |
|
| |
天高(하늘이 높다.)
日出(해가 뜬다.)
自然師也(자연은 스승이다.)
‘高’는 형용사, ‘出’은 동사, ‘師’는 명사로서 각각 서술어가 된 것이다. |
| |
주어, 서술어, 목적어로 이루어진 구조로서, 주어와 서술어의 역할은 주술 구조에서의 역할과 같고, 목적어는 행동의 대상을 나타내며, ‘~이(가) ~을(를) ~하다’로 풀이한다. 어순은 우리말과 달리 서술어가 목적어 앞에 놓인다. |
|
| |
臣事君(신하는 임금을 섬긴다.)
君使臣(임금은 신하를 부린다.) |
| |
주어, 서술어, 보어로 이루어진 구조로서, 주어와 서술어의 역할은 주술 구조에서의 역할과 같고, 보어는 주어를 보충하거나 서술어를 보충 또는 한정하여 부족한 뜻을 완전하게 보족(補足)하는 구실을 한다. ‘~은(는) ~이(가) ~하다(이다)’로 풀이한다. 어순은 우리말과 달리 서술어가 보어 앞에 놓인다. |
|
| |
人易老(사람은 늙기가 쉽다.)
學難成(학문은 이루기가 어렵다.)
家有慶(집안에 경사가 있다.)
恩深於海(은혜가 바다보다 더 깊다.) |
| |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로 이루어진 구조로서,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하여 서술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 주는 보족의 구실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서술어를 보충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이(가) ~를(을) ~에게(에서, 라고) ~하다’로 풀이한다. |
|
| |
人謂我賢(사람들이 나를 어질다고 말한다.)
孔子問禮於老子(공자가 예를 노자에게 묻다.) |
| |
자료출처 : 제7차 『고등학교 한문 교육과정해설서』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