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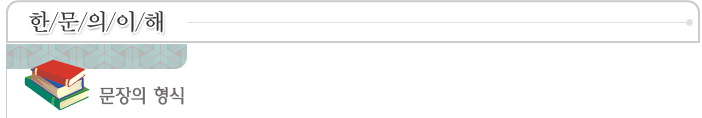
| |
| |
어떤 사실을 그대로 풀어 평범하게 서술한 문장 형식으로, 어말(語末)에 어기사(語氣詞)인 ‘也, 矣, 也已, 焉’ 등이 붙는 경우가 많다. |
|
| |
書心畵也, 言心聲也(글씨는 마음의 그림이요, 말은 마음의 소리이다.)
舟已行矣(배가 이미 떠나갔다.)
可謂好學也已(배우기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
寒暑易節, 始一反焉(겨울과 여름이 계절을 바꿔야, 비로소 한 번 되돌아간다.) |
| |
동작이나 상태, 또는 어떤 일을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문장 형식으로, 주로 부정사(否定詞)인 ‘不, 非, 未, 無, 莫’ 등이 쓰이어 ‘~이 아니다’, ‘~하지 아니하다’, ‘~하지 못하다’는 부정의 뜻을 나타낸다. |
|
| |
歲月不待人(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我非生而知之者(나는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다.)
我未見好仁者(나는 인을 좋아하는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다.)
君子居無求安(군자는 살아가면서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다.)
吾盾之堅, 莫能陷也(내 방패의 견고함은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다.) |
| |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문장 형식으로, 문두(文頭)나 문중(文中)에 ‘何, 誰, 孰, 安’ 등의 의문 대명사나 의문 부사를 쓰거나, 문말(文末)에 ‘乎, 與, 如何’ 등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기사(終結語氣詞)를 써서 의문의 뜻을 나타낸다. |
|
| |
讀書何爲(책을 읽어서 무엇합니까?)
漢陽中誰最富(한양에서 누가 가장 부자인가?)
弟子孰爲好學(제자 중에서 누가 학문을 좋아합니까?)
子將安之(그대는 장차 어디로 가려는가?)
不動心有道乎(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에 (무슨) 방도가 있습니까?)
男女授受不親, 禮與(남녀가 직접 주고받지 않는 것이 예입니까?)
以五十步, 笑百步則如何(오십 보로써 백 보를 비웃으면 어떻습니까?) |
| |
반어 부사 ‘豈, 何, 焉, 安’ 등이 종결 어기사 ‘乎, 哉, 也’ 등과 호응되거나, ‘不亦’이 ‘乎’와 호응되어 ‘어찌 ~겠는가?’, ‘무엇이 ~겠는가?’, ‘또한 ~지 아니한가?’ 등 반문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 형식으로, 반문의 형식을 통하여 강한 긍정의 뜻을 나타낸다. |
|
| |
何益之有(무슨 유익함이 있으리요?)
是豈水之性哉(이것이 어찌 물의 성질이겠는가?)
吾何畏彼哉(내가 어찌 그를 두려워하리요?)
安求其能千里也(어찌 그 말이 천 리를 달릴 수 있기를 기대하리요?)
寧無不平之心乎(어찌 불평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不亦樂乎(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
| |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若, 如, 猶, 不如, 莫如’ 등이 서술어로 쓰이거나, 전치사 ‘於, 乎’ 등이 형용사 뒤에 위치하여 ‘마치 ~와 같다’, ‘~만 못하다’, ‘~이 ~보다 더 낫다’ 등 비교나 선택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 형식이다. |
|
| |
上善若水(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學問如逆行舟(학문은 물을 거슬러 가는 배와 같다.)
仁勝不仁, 猶水勝火也(어진 자가 어질지 못한 자를 이김은 물이 불을 이김과 같다.)
至樂莫如讀書(가장 즐거운 일은 독서만한 것이 없다.)
霜葉紅於二月花(서리 맞은 잎이 이월에 피는 꽃보다 더 붉다.)
光陰速乎矢(세월이 화살보다 더 빠르다. |
| |
문두(文頭)에 ‘若, 如, 雖’ 등이 쓰이거나, 문중(文中)에 ‘則’이 쓰이거나 ‘不’ 등의 부정어(否定語)가 거듭 쓰여서 ‘만약 ~면 ~한다’, ‘가령 ~다면 ~한다’, ‘비록 ~라도 ~하다’ 등의 가정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 형식이다. |
|
| |
春若不耕, 秋無所望(봄에 만약 경작하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다.)
國雖大, 好戰必亡(나라가 비록 크다 하더라도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한다.)
水至淸則無魚(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다.)
人不學, 不知道(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도리를 모른다.) |
| |
한정 부사 ‘但, 惟, 獨’ 등을 써서 한정의 뜻을 나타내거나, 종결 어기사 ‘耳, 已, 而已, 而已矣’ 등을 써서 ‘~할 뿐이다’, ‘~할 따름이다’ 등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
|
| |
唯仁者, 能好人能惡人(오직 인자만이 남을 좋아할 수 있고 남을 미워할 수 있다.)
但無錢耳(다만 돈이 없을 뿐이다.)
直不百步耳, 是亦走也(다만 백 보가 아닐 뿐이지 이도 역시 달아난 것이다.)
今獨臣有船(지금 단지 신만이 배를 가졌을 뿐입니다.)
我知種樹而已(나는 나무 심는 것만을 알 뿐이다.)
學問之道, 求其放心而已矣(학문의 도는 그 잃어버린 양심을 구하는 것일 따름이다.) |
| |
남에게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문장 형식으로, 사동의 뜻을 나타내는 ‘使, 令, 命, 敎, 遣’ 등을 써서, ‘~로 하여금 ~게 하다’, ‘~에게 ~을 ~게 하다’ 등으로 풀이한다. |
|
| |
天帝使我長百獸(하느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짐승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였다.)
賢婦令夫貴(어진 아내는 남편으로 하여금 귀하게 한다.)
誰敎其人作此詩乎(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시를 짓게 하였는가?)
令人有遺世之想(사람으로 하여금 세속의 일을 잊어버리려는 생각을 가지게 하다.)
不尙賢, 使民不爭(어진 것을 숭상하지 않아야 백성으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한다.)
使天下無以古非今(천하로 하여금 옛 것에 기준해서 지금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다.)
天無口, 使人言(하늘은 입이 없으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 |
| |
화자가 어떤 동작을 남으로부터 받게(당하게) 됨을 나타내는 문장 형식으로, 피동 조동사 ‘見, 被’, 전치사 ‘於, 乎’나 ‘爲~ 所~’ 등을 써서, ‘~가 ~에게 ~받다(~을 당하다)’ 등으로 풀이한다. |
|
| |
信而見疑(믿을 만한데도 의심을 받는다.)
是以見放(이러한 까닭으로 추방을 당했다.)
小人役於物(소인은 사물에 부림을 당한다.)
不信乎朋友(벗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다.) |
| |
금지형은 ‘勿, 無, 毋’ 등을 써서 ‘~지 마라’라는 금지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 형식이다. 그러나 이들 글자들이 부정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
| |
己所不欲, 勿施於人(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마라.)
無道人之短(남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無欲速, 無見小利(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마라.)
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남이 자기를 알아 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고 남을 알지 못할까 근심하라.) |
| |
감탄형은 ‘嗚呼, 惡’ 등의 감탄사를 쓰거나, 문말(文末)에 ‘哉, 也, 矣’ 등의 감탄 어기사를 써서 기쁨, 슬픔, 경탄, 탄식 등의 느낌을 나타내는 문장 형식이다. |
|
| |
善哉, 言乎(훌륭하도다! 말씀이여.)
嗚呼, 老矣(아! 늙었구나.)
惡, 是何言也(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異哉, 此人之敎子也(다르구나! 이 사람이 자식을 가르치는 방법이여.) |
| |
자료출처 : 제7차 『고등학교 한문 교육과정해설서』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