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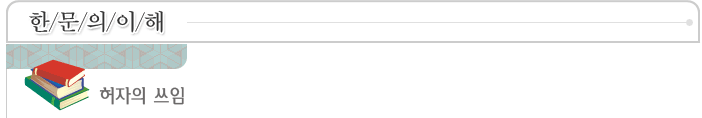
| |
| |
‘허자(虛字)’란, 글자와 글자, 어구와 어구, 글자와 어구를 이어 주거나 그 관계를 명료하게 하고, 문(文)의 어기(語氣)를 적절히 표현하여 그 뜻을 돕는 한자로서, 글자 자체가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 주로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다. 허자는 한문 문장 속에서 주로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허자는 명사류 앞에 위치하여 명사류와 서술어의 관계를 명료하게 하고 그 뜻을 돕는 전치사, 두 어구나 두 문장 사이에 위치하여 전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접속사, 문말에 위치하여 단정, 한정, 의문, 반어, 감탄 등 화자의 어기를 나타내고 문장을 종결하는 종결 어기사 등으로 나뉜다.
|
|
| |
1) 於·于·乎
명사류 앞에 놓여서 ‘전치사+명사류’의 구조를 이루어, ‘~에, ~에서, ~에는, ~에게, ~보다’ 등의 뜻으로 쓰여 ‘처소·대상·시간·원인·비교’ 등을 나타낸다. 주로 서술어 뒤에 위치하여 보어를 이끈다.
|
|
| |
月出於東天, 日落於西山(달은 동쪽 하늘에서 뜨고, 해는 서쪽 산으로 진다.)
霜葉紅於二月花(서리 맞은 잎이 이월에 피는 꽃보다 더 붉다.)
吾十有五而志于學(나는 열다섯 살에 배움에 뜻을 두었다.)
義莫大于君臣(의리는 군신의 관계보다 더 큰 것이 없다.)
光陰速乎矢(세월은 화살보다 더 빠르다.)
國之語音, 異乎中國(나라 말씀이 중국과 다르다.) |
| |
2) 以
‘以+명사류’의 구조로 주로 서술어 앞에 위치하여 서술어를 한정하는 부사어 구실을 하며, ‘~으로써, ~을 가지고, ~에 의하여, ~ 때문에’ 등의 뜻으로 쓰여서 ‘도구·자료·방법·원인·시간·자격’ 등을 나타낸다.
|
|
| |
君使臣以禮(임금은 예로써 신하를 부린다.)
不以成功自滿(성공으로 인하여 자만하지 말라.)
王待吾以國師(왕이 나를 국사로 대우하다.)
弟以其一與兄(아우가 그 중의 하나를 형에게 주다.)
以十月祭天(시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다.)
殺身以成仁(자신을 희생하여 인을 이루다.)
人以舊爲好(사람은 오래 사귄 사람을 좋게 여기다.) |
| |
3) 自·由·從
본래는 각각 ‘스스로’, ‘말미암아’, ‘좇다’의 뜻으로 쓰이는 부사나 동사인데, 전치사로 전성되어 쓰일 때에는 동작의 기점(起點)을 나타내기도 한다. 주로 ‘전치사+명사류’의 구조로 서술어 앞에 위치하여 서술어를 한정하는 부사어로 ‘~로부터’, ‘~에서’로 새긴다.
|
|
| |
自初至終(처음부터 끝까지)
自天而降乎, 從地而出乎(하늘에서 내려왔는가, 땅에서 솟았는가?)
病從口入, 禍從口出(병은 입으로부터 들어오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
福由己發, 禍由己生(복은 자기에게서 나오고, 재앙은 자기에게서 나온다.) |
| |
1) 且·與·及
어구와 어구, 문장과 문장을 접속시키며, ‘~와, ~하고’ 등의 뜻으로 쓰인다. |
|
| |
重且大(중하고도 크다.)
夫地非不廣且大也(저 땅이 넓고 크지 않은 것이 아니다.)
富與貴, 是人之所欲也(부와 귀, 이것은 사람이 바라는 것이다.) |
| |
2) 而
어구와 어구, 문장과 문장을 이어 서로 긴밀하게 해 주며, 순접일 때에는 ‘~(해)서, ~(하)고’로, 역접일 때에는 ‘~(하)나, ~(하)되, ~(하)지만’으로 풀이한다. |
|
| |
登高山而望四海(높은 산에 올라서 천하를 바라본다.)
盡人事而待天命(인사를 다하고서 천명을 기다리다.)
良藥苦於口而利於病(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 치료에는 이롭다.
千人所指, 無病而死(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 병이 없이도 죽는다.)
|
| |
3) 則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로서 ‘~이면, ~하면’으로 풀이한다. 가정 부사와 호응되기도 한다. |
|
| |
家貧則思良妻(집이 가난하면 어진 아내를 생각한다.)
見小利則大事不成(작은 이익을 따지다 보면 큰 일은 이루지 못한다.) |
| |
1) 也·矣·也已(단정)
단정, 결정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기사로 ‘~(하)다, ~(이)다’ 등으로 풀이한다. |
|
| |
孝百行之源也(효도는 모든 행동의 근원이다.)
朝聞道, 夕死可矣(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더라도 좋을 것이다.)
可謂好學也已(배움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 |
| |
2) 已·而已·而已矣·耳(한정)
화자의 생각을 한정지어 나타내는 한정 어기사로 ‘~일 뿐이다’, ‘~일 따름이다’ 등으로 풀이한다. 한정의 뜻을 가진 부사와 호응되기도 한다. |
|
| |
王之所大欲可知已(왕이 크게 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을 뿐이다.)
書足以記名姓而已(글은 성명을 쓸 줄 아는 것으로 충분할 뿐이다.)
泰伯, 其可謂至德也已矣(태백은 지극히 덕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唯在立志如何耳(오직 뜻을 세움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을 따름이다.) |
| |
3) 也·乎·與·哉(의문, 반어)
의문이나 반어의 뜻을 나타내는 어기사로 ‘~인가, ~하는가, ~겠는가’ 등으로 풀이한다. 대체로 의문 부사와 호응 관계를 이룬다. |
|
| |
當今之世, 舍我其誰也(지금 이 세상에서 나를 빼놓고 누구이겠는가?)
學而時習之, 不亦說乎(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是誰之過與(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豈可他求哉(어찌 다른 데에서 구할 수 있겠는가? |
| |
4) 哉·乎·夫·矣·也(감탄)
화자의 감탄을 나타내는 어기사로 ‘~(로)다, ~(하)구나’ 등으로 풀이한다. 감탄사와 호응되기도 하며, 문장의 도치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
|
| |
善哉 言乎(훌륭하도다! 말씀이여.)
嗚呼 痛哉(아아! 슬프도다.)
甚矣 吾衰也(심하구나! 나의 쇠함이여.)
逝者如斯夫! 不舍晝夜(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을 쉬지 않음이여.) |
| |
1) 之
동사나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수식어+之+피수식어’의 구조에서는 관형격 어기사로 쓰여 ‘~의, ~하는’으로 풀이하고, ‘주어+之+서술어’의 구조에서는 주격 어기사로 쓰여 ‘~이, ~가’ 등으로 풀이하고, ‘목적어+之+서술어+보어’인 경우는 목적격 어기사로 쓰여 ‘~을(를)’ 등으로 풀이한다. |
|
| |
子不談父之過(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법이다.)
鳥之將死, 其鳴也哀(새가 죽으려 할 때 그 울음소리가 슬프다.)
修道之謂敎(도를 닦는 것을 교라 한다.) |
| |
2) 其
‘其+명사류’의 구조일 때에는 ‘그의’의 뜻으로 관형사로 쓰이고, ‘其+동사류’의 구조일 때에는 ‘그가, 그것이’의 뜻으로 대명사로 쓰인다. |
|
| |
不知其人, 視其友(그 사람을 알지 못하거든 그의 친구를 보라.)
其聞道也, 固先乎吾(그가 도를 들음이 진실로 나보다 앞서다.) |
| |
3) 所
‘所+수식어’의 구조로 ‘~하는 바, ~하는 것’의 뜻을 나타낸다. |
|
| |
幼而不學, 老無所知(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다.)
人之所惡者, 吾亦惡之(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또한 싫어한다.) |
| |
4) 者
‘수식어+者’의 구조로 ‘~하는 사람(일, 것)’의 뜻을 나타낸다. |
|
| |
智者, 有所不能(지혜로운 사람도 할 수 없는 바가 있다.)
仁者人也, 義者宜也(인이라는 것은 사람다움이요, 의리라는 것은 마땅함이다.) |
| |
자료출처 : 제7차 『고등학교 한문 교육과정해설서』 |
|
|
|
|
|
|
|

